수잔 손택의 이야기를 빌리면, 음악과 영화는 문학과 사진에 비해 창작자의 의도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예술이다. 책과 사진의 감상에 주어진 시간 따윈 없다. 이틀, 혹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책을 들여다보고, 사진 앞에 자리를 잡는 것, 그것은 온전히 감상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영화와 음악은 제작자에 의해 감상의 시간이 주어진다. 2시간, 또는 3분.
라디오 프렌들리라는 해괴한 이데올로기가 전파된 이후, 음악은 길을 잃은 듯 보인다. 24시간 동안 라디오를 틀어놔도 4, 5분을 넘기는 음악과 마주치기 어렵다. 방송국의 변은 이렇다.
‘3분을 지나 4분이 넘어가면 청취자들이 지겨워한다. 곧 주파수가 돌아갈 것이고, 프로그램은 청취율이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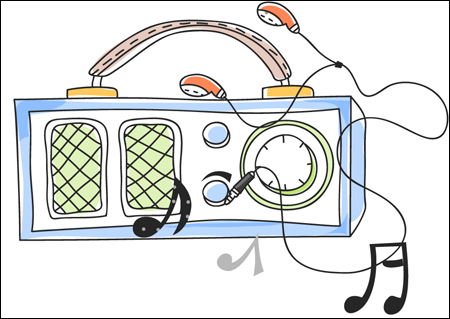
모든 것은 3분에 결정된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음악에 기승전결의 서사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다. 멜로디는 점점 짧아지거나 실종된다. 한 곡의 인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선 최소한 후크(Hook)가 두 번은 반복 되어야 한다. 인트로와 아웃트로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리듬 후크의 전성기가 도래한 것이다.
각종 차트의 이곳 저곳을 둘러봐도 순위에 올라 있는 곡엔 차이가 없다. 빅뱅, 슈퍼 주니어, 2PM, 소녀시대, 원더걸스, 2NE1. 이들의 음악에도 별 차이가 없다. 3분 진행, 리듬 후크의 반복. 서사의 부재는 감정의 이입을 차단한다. 그저 개구리처럼 피부로 리듬을 빨아 먹고, 약간의 중독을 즐긴 후, 대기 어딘가로 방출해 버린 면 끝이다. 사유나 감정의 오르가즘 따윈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대중 예술의 가치 중 하나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위로이다. 문학이 그렇고, 영화가 그렇다. 음악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금 주변의 음악들에 위로라 부를 수 있는 내용물이 담겨 있는가? 아니, 그 내용물을 담을 만한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가?
단어 몇 개만으로 배열된 글은 시를 만든다. 압축된 영상은 아방가르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음악엔 여전히 약간의 시간과 길이가 필요하다. 3분은 너무 짧다.
누군가는 격렬한 반대증명의 욕망에 사로잡힐 것이다. 좋다. 비틀즈의 <Yesterday>는 3분을 넘지 않는 걸작이다. 기꺼이 인정한다. 하지만, 그 다음엔 어떤 곡을 거론하겠는가? 여기 3분을 훌쩍 넘기는 걸작들의 리스트가 있다. 레드 제플린 <Stairway To Heaven>, 퀸 <Bohemian Rhapsody>, 르네상스 <Ocean Gipsy>, 마이클 잭슨 <Thriller>, 프린스 <Purple Rain>, 조용필 <킬리만자로의 표범>, 산울림 <황무지>. 게임은 이미 끝난 듯 보이지 않는가?
현대 음악의 거장 존 케이지의 무성곡 퍼포먼스 <4분 33초>도 음의 진공을 4분, 그리고 33초 동안 지속시켰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경이롭기까지 하다. 어떤 음도 연주하지 않은 채, 4분 33초를 버틸 수 있었다니.
라디오여 4분짜리 음악을 허하라! 격렬한 섹스보단, 부드러운 전희와 달콤한 포옹을 맛볼 수 있도록. 잠시나마 음악을 통해 위로와 사색, 그리고 친절한 충고를 들을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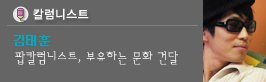
trackback from: Hans의 생각
답글삭제라디오여, 4분짜리 음악을 허하라!<인터파크웹진> 3분짜리 음악에 질려버렸다. 이건 일종의 역설이다. 곡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음악은 지겨워진다. 수잔 손택의 이야기를 빌리면, 음악과 영화는 문학과 사진에 비해 창작자의 의도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예술이다. 책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