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라는 존재는 말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따지자면 간단한 노릇이지만 어디 어머니라는 말에 담긴 함의가 단지 그것 뿐인가. 하나의 존재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 쉬고 있는 누군가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무의식의 밑바닥에서 지워지지 않는 존재기도 하다. 좀 어려운 말을 쓰자면 존재의 시원(始原)이며 영원한 고향이다.
그런 까닭인지 여성이 어머니로서 갖는 모성애 역시 일종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자리잡아왔다. 신화의 영역에서도 대지의 여신이나 농업의 여신은 거의 여성인데 이는 여성이 갖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일종의 신격화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근대에 와서 프로이트와 같이 까칠한 정신분석학자는 “모성애는 성호르몬의 분비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이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 노릇이다. 비록 현대의 대중서사에 와서 모성애의 신화를 정면으로, 혹은 은근슬쩍 박살내는 전복적 담화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했지만 비교적 보수적 가치관이 만만치 않게 자리잡은 한국 사회에서 이런 전복적 서사의 등장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 짐작 했었다.

그런 점에서 올 상반기에 개봉했던 봉준호의 신작 <마더>(2009)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영화다. 영화를 보기 전, ‘아들의 무죄를 밝혀내려는 어머니의 악전고투’라는 정도의 스포일러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이 영화가 만들어 낸 어머니, 혹은 모성애의 캐릭터 구축은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물게 서늘한 칼날을 보여줄지는 몰랐다. 결코 미화될 수 없지만 선뜻 비난하기 힘든 어느 가난한 ‘엄마’(김혜자)의 광기어린 자식 사랑을, 도덕적 부패가 대중들의 내면까지 침윤해 들어온 불안한 세상 속으로 들이밀며 말이다.
‘엄마’는 아들 도준(원빈)을 광적으로 사랑한다. 다소 모자란 아들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잠시도 눈에서 떼지 않으려 하고 몸에 좋은 걸 끊임없이 먹이려 한다.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까지는 어느 어머니나 대강 공통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은 ‘어떤 사건’이 있기 전, 즉 영화 시작부터 계속 불안하다. 단지 모자란 아들이 불안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아들이 살인혐의를 뒤집어쓰고 자식을 구하기 위한 엄마의 모험이 시작되면서 이 불안감은 증폭되고 단 한 순간 실체를 드러낸다.
모성 내면에 깔려 있는 불안은 과거의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며 이는 아들을 구하기 위한 또 다른 행위로 연결되어진다. 단지 모자간에 잘 살고 싶다는 단순한 욕망으로 보였지만 실은 끝내 속죄하지 못한 자의 발버둥이며 그 발버둥 끝에 또다시 손에 피를 묻히는 잔인한 순환이다. 제 아무리 신통한 침자리를 뚫어도 그녀 가슴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 그녀가 아들 대신 죄를 뒤집어 쓴 다운증후군 환자에게 던지는 “넌 엄마가 없니?”라는 질문은 서글픈 변명이지만 유일한 도피처이기도 하다.
사실 <마더>는 단지 모성애의 광기를 전시하려는 영화가 아니다. 오히려 어렵지만 오순도순 단란한 가정이라는 신화가 깨져버린 IMF 이후 한국 사회의 지옥도를 전제하고 바라봐야 한다. 하층민 엄마의 모성애는 불안한 일상 속에 간신히 지탱될 뿐이고 균열과 함께 파국이 찾아온다. 영화의 다층적인 의미망 속에서 모성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종국에 자식과 사실상의 공범 관계가 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가족이란 지독한 형벌일 뿐이다.
모성애의 어두운 이면을 그리는 영화가 모두 이처럼 사회적 의미로 해석되거나 우울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반지의 제왕> 3부작으로 더 익숙해진 피터 잭슨이 뉴질랜드의 악동(?) 시절 만들었던 컬트 좀비 영화 <데드얼라이브>(1992)는 그야말로 괴물적인 모성애를 잔혹과 코믹 사이에서 보여준 바 있다.

좀비가 된 어머니란 설정도 끔직한 노릇이지만 그렇게 된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노총각 아들(티모시 밤)의 모습은 황당하기조차 하다. 탐욕스럽고 아들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어머니는 인간이던 시절에도 이미 충분히 괴물 같았다. 그녀가 좀비가 된 것도 사실 아들의 데이트를 방해하고 감시하다가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다. 사실 자식에게 집착하며 애정을 가로막는 어머니의 설정은 낯선 것이 아니다. 결혼한 아들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영화로 <올가미>(1997)나 <블러드 라인>(1998) 같은 작품들이 있고 딸의 사랑을 가로막는 마녀 같은 어머니의 모습도 <광란의 사랑>(1990)에서 충분히 봤다. 그러나 자식에게 집착하다가 좀비가 되버리는 이 영화의 직설화법은 쉽게 감당이 안된다.
여하간 효자인 아들은 어머니가 좀비가 된 이후에도 그녀를 모시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을이 좀비 천지가 되고(감독이 특유의 블랙유머로 포장해서 그나마 볼만하지 선혈이 낭자한 장면이 계속 이어진다.) 여자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기 직전까지도 그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다분히 히치콕의 <사이코>를 패러디한 설정을 통해 어머니의 괴물 같은 모성은 결국 아들 내면에 원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녀석은 효자이기 이전에 마마보이였던 것이다! 그러니 영화의 마지막에서 아들이 자신을 삼킨 좀비 어머니의 거대한 자궁을 가르고 나오는 것은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해결책이다. 직접 집도한 제왕절개를 통해 아들은 어른이 되고 어머니는 안식을 찾는 것이다.
밀폐된 승강기에서 옆에 서 있던 어머니가 “내가 니 엄마로 보이니?”라고 물었다는 식의 괴담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모성의 친숙함을 배신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공포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의 낯선 이면에 대한 불안감을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영화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모성은 보호인 동시에 감금이며 자식 외의 존재에 대한 공격적 투쟁심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에서 ‘엄마들’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와 사랑을 접어버리기란 쉽지 않겠지만 명민한 창작자들은 그런 걸 파고든다. 잔인하고 깊숙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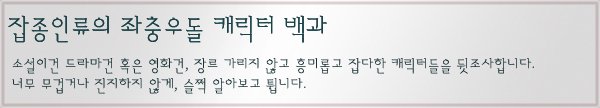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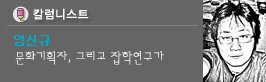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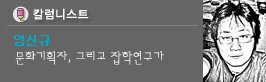

trackback from: Hans의 생각
답글삭제내 어머니의 낯선 얼굴 <인터파크웹진> ‘어머니’라는 존재는 말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따지자면 간단한 노릇이지만 어디 어머니라는 말에 담긴 함의가 단지 그것 뿐인가. 하나의 존재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 쉬고 있는..